포토뉴스
- 알림마당
- 뉴스룸
- 포토뉴스
[지하철 에피소드 공모전 인천메트로 사장상 수상작]아내의 지하철
-
- 작성자
- 홍보부(홍보부)
- 작성일
- 2011년 3월 9일(수) 00:00:00
-
- 조회수
- 9323
- 첨부파일
-
 아내의지하철.jpg [506KByte]
아내의지하철.jpg [506KBy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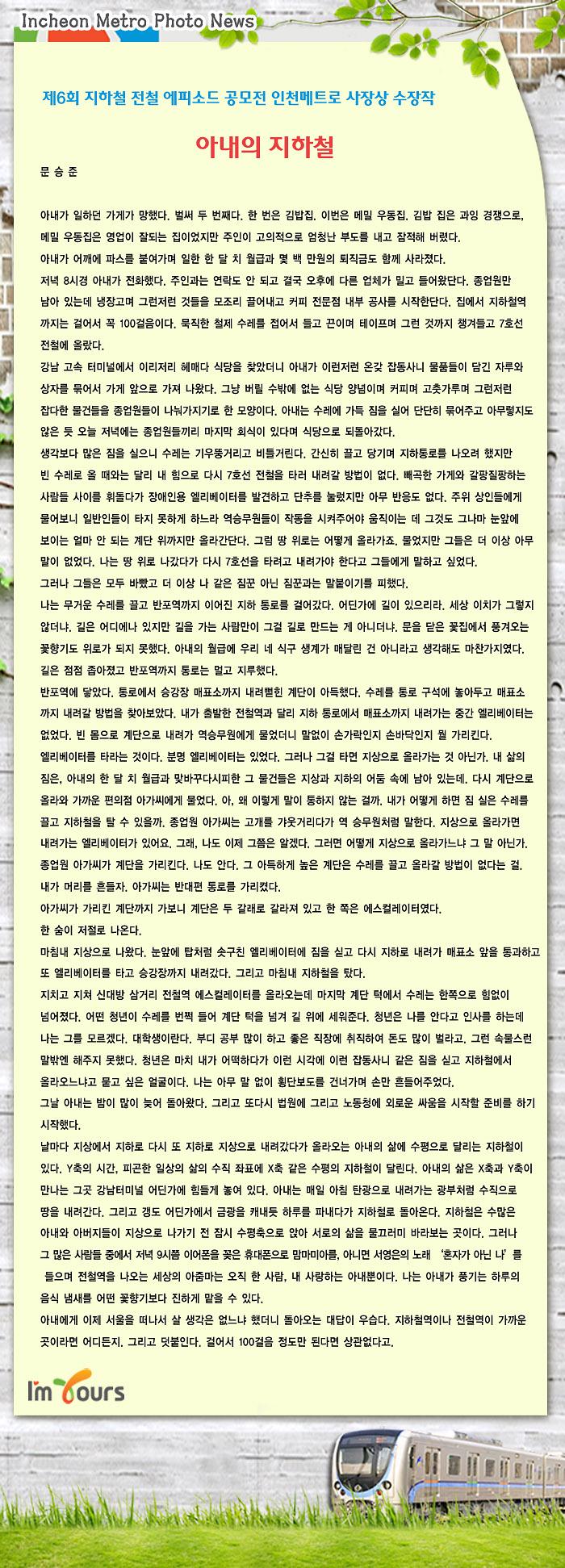 아내의지하철.jpg (506KByte) 사진 다운받기
아내의지하철.jpg (506KByte) 사진 다운받기
/첨부1/
[제6회 지하철 전철 에피소드 공모전 인천메트로 사장상 수상작]
아내의 지하철
문승준
아내가 일하던 가게가 망했다. 벌써 두 번째다. 한 번은 김밥집. 이번은 메밀 우동집. 김밥 집은 과잉 경쟁으로, 메밀 우동집은 영업이 잘되는 집이었지만 주인이 고의적으로 엄청난 부도를 내고 잠적해 버렸다. 아내가 어깨에 파스를 붙여가며 일한 한 달 치 월급과 몇 백 만원의 퇴직금도 함께 사라졌다.
저녁 8시경 아내가 전화했다. 주인과는 연락도 안 되고 결국 오후에 다른 업체가 밀고 들어왔단다. 종업원만 남아 있는데 냉장고며 그런저런 것들을 모조리 끌어내고 커피 전문점 내부 공사를 시작한단다.
집에서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꼭 100걸음이다. 묵직한 철제 수레를 접어서 들고 끈이며 테이프며 그런 것까지 챙겨들고 7호선 전철에 올랐다.
강남 고속 터미널에서 이리저리 헤매다 식당을 찾았더니 아내가 이런저런 온갖 잡동사니 물품들이 담긴 자루와 상자를 묶어서 가게 앞으로 가져 나왔다.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식당 양념이며 커피며 고춧가루며 그런저런 잡다한 물건들을 종업원들이 나눠가지기로 한 모양이다. 아내는 수레에 가득 짐을 실어 단단히 묶어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오늘 저녁에는 종업원들끼리 마지막 회식이 있다며 식당으로 되돌아갔다.
생각보다 많은 짐을 실으니 수레는 기우뚱거리고 비틀거린다. 간신히 끌고 당기며 지하통로를 나오려 했지만 빈 수레로 올 때와는 달리 내 힘으로 다시 7호선 전철을 타러 내려갈 방법이 없다. 빼곡한 가게와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사이를 휘돌다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발견하고 단추를 눌렀지만 아무 반응도 없다. 주위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일반인들이 타지 못하게 하느라 역승무원들이 작동을 시켜주어야 움직이는 데 그것도 그나마 눈앞에 보이는 얼마 안 되는 계단 위까지만 올라간단다. 그럼 땅 위로는 어떻게 올라가죠. 물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땅 위로 나갔다가 다시 7호선을 타려고 내려가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바빴고 더 이상 나 같은 짐꾼 아닌 짐꾼과는 말붙이기를 피했다.
나는 무거운 수레를 끌고 반포역까지 이어진 지하 통로를 걸어갔다. 어딘가에 길이 있으리라.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더냐. 길은 어디에나 있지만 길을 가는 사람만이 그걸 길로 만드는 게 아니더냐. 문을 닫은 꽃집에서 풍겨오는 꽃향기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아내의 월급에 우리 네 식구 생계가 매달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였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반포역까지 통로는 멀고 지루했다.
반포역에 닿았다. 통로에서 승강장 매표소까지 내려뻗힌 계단이 아득했다. 수레를 통로 구석에 놓아두고 매표소까지 내려갈 방법을 찾아보았다. 내가 출발한 전철역과 달리 지하 통로에서 매표소까지 내려가는 중간 엘리베이터는 없었다. 빈 몸으로 계단으로 내려가 역승무원에게 물었더니 말없이 손가락인지 손바닥인지 뭘 가리킨다. 엘리베이터를 타라는 것이다. 분명 엘리베이터는 있었다. 그러나 그걸 타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 아닌가. 내 삶의 짐은, 아내의 한 달 치 월급과 맞바꾸다시피한 그 물건들은 지상과 지하의 어둠 속에 남아 있는데. 다시 계단으로 올라와 가까운 편의점 아가씨에게 물었다. 아, 왜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짐 실은 수레를 끌고 지하철을 탈 수 있을까. 종업원 아가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역 승무원처럼 말한다. 지상으로 올라가면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 나도 이제 그쯤은 알겠다. 그러면 어떻게 지상으로 올라가느냐 그 말 아닌가. 종업원 아가씨가 계단을 가리킨다. 나도 안다. 그 아득하게 높은 계단은 수레를 끌고 올라갈 방법이 없다는 걸. 내가 머리를 흔들자. 아가씨는 반대편 통로를 가리켰다.
아가씨가 가리킨 계단까지 가보니 계단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고 한 쪽은 에스컬레이터였다. 한 숨이 저절로 나온다.
마침내 지상으로 나왔다. 눈앞에 탑처럼 솟구친 엘리베이터에 짐을 싣고 다시 지하로 내려가 매표소 앞을 통과하고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승강장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지하철을 탔다.
지치고 지쳐 신대방 삼거리 전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올라오는데 마지막 계단 턱에서 수레는 한쪽으로 힘없이 넘어졌다. 어떤 청년이 수레를 번쩍 들어 계단 턱을 넘겨 길 위에 세워준다. 청년은 나를 안다고 인사를 하는데 나는 그를 모르겠다. 대학생이란다. 부디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돈도 많이 벌라고. 그런 속물스런 말밖엔 해주지 못했다. 청년은 마치 내가 어떡하다가 이런 시각에 이런 잡동사니 같은 짐을 싣고 지하철에서 올라오느냐고 묻고 싶은 얼굴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며 손만 흔들어주었다.
그날 아내는 밤이 많이 늦어 돌아왔다. 그리고 또다시 법원에 그리고 노동청에 외로운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날마다 지상에서 지하로 다시 또 지하로 지상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아내의 삶에 수평으로 달리는 지하철이 있다. Y축의 시간, 피곤한 일상의 삶의 수직 좌표에 X축 같은 수평의 지하철이 달린다. 아내의 삶은 X축과 Y축이 만나는 그곳 강남터미널 어딘가에 힘들게 놓여 있다. 아내는 매일 아침 탄광으로 내려가는 광부처럼 수직으로 땅을 내려간다. 그리고 갱도 어딘가에서 금광을 캐내듯 하루를 파내다가 지하철로 돌아온다. 지하철은 수많은 아내와 아버지들이 지상으로 나가기 전 잠시 수평축으로 앉아 서로의 삶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곳이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녁 9시쯤 이어폰을 꽂은 휴대폰으로 맘마미아를, 아니면 서영은의 노래 ‘혼자가 아닌 나’를 들으며 전철역을 나오는 세상의 아줌마는 오직 한 사람, 내 사랑하는 아내뿐이다. 나는 아내가 풍기는 하루의 음식 냄새를 어떤 꽃향기보다 진하게 맡을 수 있다.
아내에게 이제 서울을 떠나서 살 생각은 없느냐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우습다. 지하철역이나 전철역이 가까운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리고 덧붙인다. 걸어서 100걸음 정도만 된다면 상관없다고.
- 담당부서
- 미디어팀 032-451-2162



